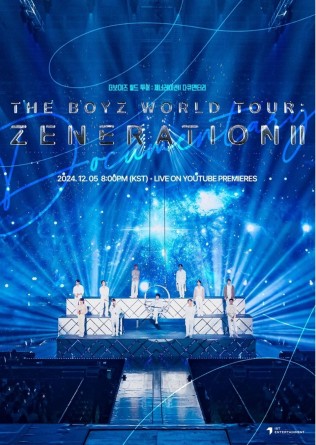[박정은의 '잼있게 미술읽기']-스캔들 명화 '올랭피아'
기사 등록 2011-12-18 17:44
Copyright ⓒ Issuedaily. 즐겁고 신나고 유익한 뉴스, 이슈데일리(www.issuedaily.com) 무단 전재 배포금지

에두아르 마네 [올랭피아],캔버스에 유화,1863년,파리 오르세 미술관.
[박정은 미술컬럼 전문기자] 한 젊은 여자가 나체로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느긋하게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왼손을 허벅지에 얹어 놓았으며 귀걸이와 오른팔에는 팔찌를 하고 있고 목에는 가느다란 검정 초커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뒤로 넘긴 머리에는 빨간 난초를 꽂았으며 꼬고있는 발목의 높은굽 슬리퍼는 왼발에 달랑거리고 있습니다. 뒤에 서 있는 흑인여자가 오만한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고 등을 높직하게 둥글린 검은 고양이가 침대 발치에 있습니다.
침대의 하얀 시트가 구겨진 것으로 보아 사용한지 얼마 안되었음을 진작케 하여 그림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여러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 작품은 서구 미술사에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큰 스캔들을 일으킨 마네의 '올랭피아'입니다.
전혀 부끄러움을 타지않고 우리를 빤히 쳐다보는 그녀의 모습이 낮설지가 않은건 마네의 '풀밭위의 식사'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뻔뻔하게 우리를 쳐다 보았던 그녀와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네는 이상화된 여성이 아닌 매춘부를 그렸습니다.풍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올랭피아'는 사회에 대한 반항이었으며, 회화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서구 400년 역사에 대한 난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65년 살롱에 출품 되었을때 당시의 신문이나 비평가들은 천박하고 뻔뻔스러운 작품이라고 공격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출산을 앞둔 부인과 양가의 자녀들은 아무쪼록 피해서 지나가야할 작품'이라는 문구가 저널리즘의 지면을 흔들었습니다. 공격은 말로만 그치지않고 살롱 전시장으로 몰려든 관람객들이 지팡이로 작품을 두드렸으며 소란이 자주 일어나서 주최측에서 '올랭피아'만 맨 마지막방의 문위의 어두운 벽으로 옮겨 걸었을 정도로 큰 소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도데체 이 작품의 어디가 그렇게 큰 스캔들을 일으킨것 일까요?
단지 벌거벗은 여자 때문에...?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델의 포즈가 너무 대담해서...? 벌거벗은 여자 그림은 르네상스이래로 수도 없이 그려져 왔고 '올랭피아'의 그녀만큼 대담한 포즈를 취한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티치아노[우르비노의 비너스],캔버스에 유화,1538년경,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현재 피란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티치아노의 명작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마네의 '올랭피아'의 구도가 거의 완벽하리만큼 흡사한데도 불구하고,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일찍부터 전 유럽에 명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가 뻔뻔하거나 천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았듯이 '올랭피아'역시 포즈가 대담하다고 비난 받을 이유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그려진 모티브 자체는 결코 사람들의 격노를 살만한 일이 아니였던 것 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올랭피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과 경멸을 퍼붓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역사적 의미 때문일 것 입니다.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구도는 매우 흡사 하지만 두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이 받는 느낌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가 그림을 보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기쁨과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다면 '올랭피아'는 어딘지 불안하고 도전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한 당시의 저널리즘과 시민들의 비난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그 시대입니다. 나폴레옹3세 정부는 마네의 친구였던 보들레르의 '악의꽃'을 고발했던 정부입니다. 외면적인 화려함과는 다르게 19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풍기 단속이 엄격했던 시대였습니다. 당대의 풍조를 그대로 드러낸것이 스캔들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마네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랬듯이 일생동안 저평가 되었지만 기성사회에 당당히 맞섰으며 전통회화의 관습을 깼습니다. 창의적인 그의 작품은 표현의 자유를 누린 대신 시대적인 혹독한 댓가를 치루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박정은 pyk7302@naver.com
미국 뉴욕증시, 블랙프라이데이에 다우-S&P 사상 최고치 기..
김연경, '통산 4번째' 올스타전 남녀부 통합 최다 득표
NCT DREAM, "칠드림이 선사할 꿈과 감동의 3일"...29일 고..
‘X를 담아, 당신에게’ 12월 개봉...올리비아 콜맨×제시..
돌아온 '송강호표' 코미디...'1승' 루저 향한 강스파이크 ..
'선을 넘는 클래스' 전현무 "NCT 도영 한국사 1급 위해 공..
'별들에게 물어봐', 이민호x공효진 신비스러운 우주 풍경 ..
이해인, 4대륙 선수권 티켓 걸린 피겨 대표 1차 선발전 출..
노래하는 예성과 기타치는 원빈의 만남...SM 대선배 슈퍼주..
트와이스, 새 앨범 수록곡 'Magical'로 따스한 겨울 분위기..
미국 뉴욕증시, 블랙프라이데이에 다우-S&P 사상 최고치..
KB국민카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
애큐온캐피탈, 서스틴베스트 ‘2024 하반기 ESG 평가’ ..
김연경, '통산 4번째' 올스타전 남녀부 통합 최다 득표
이율린, ‘데뷔 2년 만에 첫 준우승’ 엠텔리 10월의 MI..
NCT DREAM, "칠드림이 선사할 꿈과 감동의 3일"...29일 ..
더보이즈, 다큐멘터리 공개...월드 투어 제작기 킥오프 ..
트레저, 신곡 티저 포스터 기습 공개..."트레저만의 설렘..
국내 최초 캬바레 전용 공간 ‘캬바레 성수’ 12월 개관..
‘X를 담아, 당신에게’ 12월 개봉...올리비아 콜맨×제..